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5화. 딸락, 작지만 정직한 도시에서
— 5월 18일~20일, 무계획의 여정 속, 잠시 멈춘 하루들 —
첫째 날 – 천천히, 딸락 속으로 들어가기
아침은 고등어 굽는 냄새였다.
무에르토 하우스의 작은 주방에서 풍겨오는 향,
그리고 주인이 건넨 달걀 프라이와 마늘밥.
딸락에서의 첫 아침은 그렇게 진심이었다.
시내는 작았다. 하지만 걷는 데엔 딱 좋았다.
딸락 대성당(Tarlac Cathedral)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성당은 오래된 돌담과 고요한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햇살 아래에서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시장 골목으로 이어지는 길목,
삶은 땅콩, 튀긴 시그시그, 바나나큐를 파는 노점상들 사이로 걸었다.
“Tikman mo ito. 맛 좀 봐요.”
처음보는 얼굴에도 선뜻 권해주는 손길,
필리핀의 거리에서는 늘 낯섦과 환대가 동시에 온다.
둘째 날 – 딸락의 속살을 걷다
두 번째 날은 뚜벅뚜벅, 농촌 마을 방향으로 걸어보기로 했다.
시내버스를 타고 조금 나아가면,
딸락 농업대학(Tarlac Agricultural University) 인근 시골길이 열린다.
논은 여전히 하늘과 싸우는 중이었다.
더운 바람 속에서, 삽을 든 농부가 내게 손을 흔든다.
“Mainit ngayon, pero maganda ang araw.”
더워도, 좋은 날이라는 인사.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길가에서는 ‘파야판(fried carabao skin)’을 팔고 있었고,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먹었다.
씹는 맛은 질기고, 소금기 섞인 바람은 짭짤했다.
그곳에 앉아 있으니, 어디론가 갈 필요가 없었다.
‘이게 하루라면, 오늘은 충분하다’ 싶은 그런 기분.
셋째 날 – 작별 인사를 준비하며
마지막 날, 딸락의 바랑가이(동네)를 하나하나 걸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 유니폼을 입고 장난을 치고,
어떤 아이는 내게 다가와 묻는다.
“Are you Korean?”
“응, 한국에서 왔어.”
“Annyeonghaseyo!”
갑작스러운 인사에, 나는 크게 웃었다.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시니강(sinigang)’과 ‘토르통 탈롱(tortang talong)’
익숙해질 만하니 떠나야 한다는 게, 늘 여행의 아이러니였다.
버스터미널로 돌아가기 전,
딸락의 작은 도서관에 들렀다.
책을 읽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5월 20일. 딸락에서의 마지막 날.
작고 조용한 도시, 사람들의 진심, 뜨거운 옥수수와 짭짤한 바람,
하늘과 논이 싸우던 곳.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춤’이라는 여행의 기술을 배웠다.”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6화. 딸락에서 다구판까지, 창밖 풍경은 나를 비춘다
5월 21일, 아침 8시 반.
딸락의 마지막 아침.
무에르토 하우스의 아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했다.
“다구판 간다고요? 거기, 시장 냄새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지만, 기억해두었다.
딸락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천천히 걸어 10분.
Five Star 버스. 정직한 이름의 회사.
표를 끊으려다, 멋쩍은 실수를 했다.
"티켓 안 끊고 버스 먼저 탔다가 내림."
기사는 웃으며 말했다.
"Sir, terminal first. Not today’s adventure yet!"
오전 9시 10분, 딸락을 뒤로하고 출발.
좌석은 널찍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창밖은 천천히 움직였다.
밭에서 손 흔드는 농부, 물을 길어오는 소년,
간이정류장 옆 커다란 망고나무.
그 풍경들 사이로,
나는 이번 여행의 이유를 생각해보았다.
떠나는 사람은 언제나 궁금하다.
다음 도시는 어떤 맛일까?
정오 무렵, 다구판 시티 터미널 도착.
처음 내리는 도시에서 나는 항상 한 박자 느리다.
“아, 여기가... 다구판이구나.”
처음 밟는 땅은 낯설지만, 그 낯섦이 좋아서 계속 걷게 된다.
많은 트라이시클, 붐비는 시장 골목,
그리고 길거리에서 팔리는 생선과 오징어들.
그제야 아침 아주머니 말이 떠올랐다.
“시장 냄새 좋아요.”
숙소는 즉흥적으로 정했다.
버스터미널에서 조금만 걸으니
**"Hotel Monde"**라는 작은 간판.
낡았지만, 조용했고, 프런트 직원은 친절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해요. 창문도 있고요.”
짐을 풀고, 샤워도 미루고, 배부터 챙기기로 했다.
도시의 첫인상은 늘 배에서 시작된다.
다구판 저녁은 ‘카우아얀 그릴’(Kawayan Grill).
나무로 된 벤치, 대나무 장식, 그리고 숯불 향기.
바비큐 플래터와 방우스 시니강,
그리고 서빙된 마늘밥은
이 도시가 얼마나 소박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지 보여줬다.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롭지 않은 이유는
도시가 말을 걸어올 때다.
돌아오는 길, CSI 마트에 들렀다.
산 미구엘 맥주 한 캔,
그리고 바삭한 치차론 하나.
가볍지만 늦은 밤을 함께할 친구들.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창밖을 봤다.
지프니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든다.
나는 노트를 꺼내 짧게 적었다.
“5월 21일. 다구판 도착.”
“논에서 시장으로, 고요에서 소란으로.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걷고 있다.”
이제 내일이 시작된다.
다구판에서의 5일, 물의 도시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한다.
'연재(Series) >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1화/12화 (3) | 2025.04.19 |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9화/10화 (5) | 2025.04.18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7화/8화 (4) | 2025.04.17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3화/4화 (1) | 2025.04.16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화/2화 (1) | 2025.04.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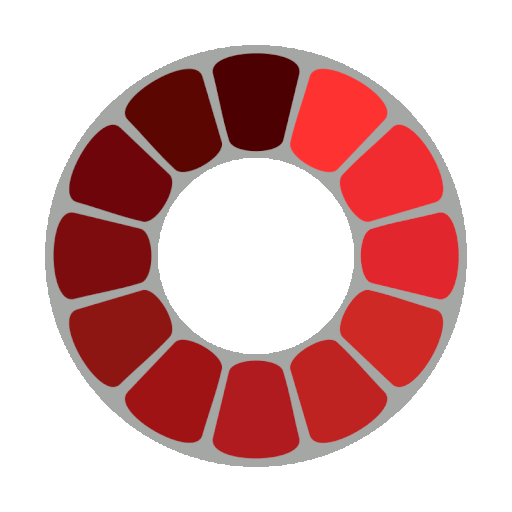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