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제15화: 본톡 지나 험난한 뱅드(Bangued)로 가는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도착하는 풍경 마음......
뱅드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이 꺾여 내려가는 골짜기 같았다. 본톡의 마지막 이슬을 털어내며 버스를 탔을 때, 나는 그곳을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질문을 가슴속에 넣고 있었다. 도로는 험했고, 산의 그림자는 점점 낮게 깔렸다.
시간이 아닌 거리의 피로가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모든 기대가 사라졌을 때, 처음 보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뱅드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이야기 끝에 겨우 마주하는 마지막 장면처럼,
그 풍경은 말을 걸어왔다.
“이제, 숨 좀 쉬어도 돼요.”
이제는 바람과 햇살을 기록해본다. 뱅드에 도착한 그날의 오후를, 아주 조용하게.
뱅드 도착 후 첫 인상
버스는 한참을 흔들리다 이윽고 뱅드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태양은 아직 머물고 있었지만, 열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가로수 아래 쪼그리고 앉아 있던 노인과, 그 옆에서 멍하니 구름을 보던 아이.
무심한 하루의 끝에서 마주한 그 풍경은
‘여기까지 잘 왔다’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다.
짐을 들고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다.
도시는 조용했다. 마치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처럼.
세차게 울리는 트라이시클의 경적소리조차,
이곳에선 이상하게 부드럽게 들렸다.
“Where are you going, sir?”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꿨다.
허름한 흰 셔츠를 입은 젊은 기사가 묻는다.
나는 그냥, “그냥 시내 한 바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Then welcome to Bangued ride.”
시장 안에서 만난 작은 감동
뱅드 퍼블릭 마켓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삶이 가득했다.
생선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고,
바나나를 쌓아 올리던 소년은 낯선 이에게도 따뜻했다.
“조용해서 좋아요, 여긴.”
나는 중얼이듯 말했고,
한 옆 가게의 할머니는
마치 마음을 읽은 듯, 마늘을 까다 말고 대답했다.
“조용하지요. 그래도, 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여긴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젖었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삶,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긴 여행의 이유처럼 느껴졌다.
로컬 식당에서 들려온 이야기
“Adobo rice with egg 하나요. Ice tea도요.”
작고 오래된 식당. 전선이 엉켜 있고, 천장엔 선풍기가 삐걱댄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진짜 ‘뱅드’를 만났다.
주인아저씨는 내 주문을 받으며
내게 물었다.
“From Manila?”
“Not this time. I walked from Banaue… via Bontoc.”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You walk too far. You must be tired. But, that’s something. Not many people do that.”
그 한마디에, 긴 여정의 모든 발걸음이 보상받은 듯했다.
아저씨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계란 프라이를 하나 더 얹어주었다.
“Extra egg. You deserve.”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제16화: 뱅드, 사흘하고도 하루 – 풍경은 걷는 자의 마음을 닮는다
잠든 밤과 깨어나는 아침
피곤했다. 그날 밤, 나는 호텔이라 하기에도 애매한 숙소에서
수건처럼 축 늘어진 하루를 벗고 누웠다.
에어컨도 없고, 창밖의 개 짖는 소리에 잠이 몇 번이나 깼지만,
그래도... 그건 피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서야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6월 16일 아침.
조용한 뱅드의 아침은 여유로웠다.
시계 소리도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는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에 살았던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다.
6월 16일 – 카피톨과 성당, 그리고 강가의 묵상
*뱅드 주청사(Abra Provincial Capitol)*는
스페인풍 기둥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정문 앞의 조형물들은 시대를 말하는 듯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산 그림자는,
내가 멀리서 걸어온 여정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St. James the Elder Cathedral)*에서는
낡은 벽돌과 촛불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생각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그 시간 자체가 기도 같았다.
점심은 근처 작은 로컬 식당에서 먹었다.
돼지고기를 넣은 시니강.
시큼한 국물은 이상하게
여행자에게 '집밥' 같은 위로를 준다.
오후엔 칼라바간 강(Abra River) 근처를 걸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시간,
나는 그 강가에서 오래된 시간을 걷고 있었다.
6월 17일 – 티네그 폭포(Tineg Falls) 가는 험한 길
이 날은 일찍 일어났다.
트라이시클을 타고, 로컬 기사와 함께 산길을 넘고 또 넘었다.
티네그 폭포로 가는 길은 악명 높았지만,
그래서 더 걷고 싶었다.
‘쉬운 길에는, 기억이 남지 않는다.’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두어 시간 만에 폭포 앞에 섰을 때,
그 물줄기는 마치 환영처럼 나를 반겼다.
"Welcome back,"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6월 18일 – 산마테오 언덕과 하얀 예배당
조용한 날이었다.
이 날은 뱅드 시내에서 멀지 않은 산마테오 언덕으로 향했다.
정상에는 하얀 예배당 하나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나는 그 문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찬양도 없고, 설교도 없고,
심지어 앉을 의자조차 없었지만,
마음은 무릎 꿇은 듯 고요했다.
6월 19일 – 로컬 마켓 마지막 투어와 밤의 인사
여행의 마지막 날은 언제나 다르다.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다.
시장에 다시 갔다.
그 바나나 소년은 이번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Going home?”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Not yet. Just going somewhere else.”
저녁, 다시 칼라바간 강가를 걸었다.
하늘은 붉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는 이 도시가 익숙하다.
낯선 곳이 아니라,
조용히 다녀간 기억의 주소가 된 것이다.
'연재(Series) >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9화/20화 (1) | 2025.05.03 |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7화/18화 (0) | 2025.04.29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3화/14화 (2) | 2025.04.20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1화/12화 (3) | 2025.04.19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9화/10화 (5) | 2025.04.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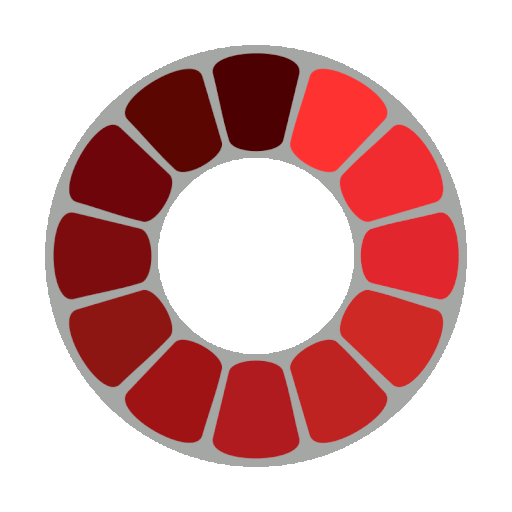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