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23화 - 라오그(Laoag)에서 클라베리아(Claveria, Cagayan) 가는 길
7월 9일 아침.
라오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다.
며칠 동안 머물렀던 Partas Bus Terminal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나서며, 이 도시에서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숙소 주인이 건네준 따뜻한 판 데 살(Pan de Sal) 한 조각과 진한 바랑가이 커피 한 잔으로 간단한 아침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GV Florida Transport 터미널로 향한다.
그러나 여행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법.
클라베리아(Claveria, Cagayan)로 가는 직행 버스는 이미 출발했거나, 당분간 운행 예정이 없다는 소식이다.
터미널 직원의 설명은 불친절하고, 영어도 통하지 않아 답답함이 밀려온다.
배는 점점 고파오고, 무더운 날씨에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그때, 한 대의 낡은 GV Florida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온다.
"클라베리아 가나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숨을 헐떡이는 듯한 버스지만, 지금은 천군만마처럼 반갑다.
겨우 자리를 잡고 출발한다.
버스는 이내 도시를 벗어나, 점점 사람의 기척이 사라진 길로 접어든다.
창밖 풍경은 황량하고, 썰렁하다.
끝없이 이어지는 논과 밭, 가끔씩 보이는 낡은 집, 말없이 걸어가는 노인.
그 고요함이 마음속까지 스며든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지난 여행들이 문득 떠오른다.
바탕가스의 해변에서 만난 소녀, 비간의 골목길에서 손을 흔들던 노인,
그리고 이름도 잊힌 어떤 도시에서 웃어주던 아주머니.
시간이 흘렀어도, 그 얼굴들이 기억의 창고 어딘가에서 다시 피어난다.
사람은 장소보다 오래 남는다.
버스는 여전히 덜컹거리며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고, 낯선 길을 달린다.
어느덧 해는 기울고, 도착한 클라베리아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처음으로 마주한 도시는, 그 조용함으로 나를 맞이했다.
급하게 가장 저렴한 숙소를 찾았다.
Casa Grand Inn.
해변가에 위치한 이 숙소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하다.
방은 넓고, 에어컨도 잘 작동한다.
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간다.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없다.
한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한다.
무언가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의 공복을 위로하기엔 충분하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눕는다.
천장은 낮고,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돌아간다.
하지만 그런 소리조차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악처럼 들린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흘렀다.
계획보다 느리고, 예정보다 불편했지만
그렇기에 더 오래 기억될 하루였다.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24화 - 클라베리아(Claveria, Cagayan) 그 조용함과 바다
7월 10일 아침.
어제 늦게 도착했던 클라베리아(Claveria, Cagayan).
밤엔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아침 햇살 아래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숙소 Casa Grand Inn의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와 함께 미세한 소금기 섞인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은 도시의 먼지를 닦아주는 것처럼 청량하다.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남짓. 슬리퍼만 신고 나선다.
모래사장은 텅 비어 있고, 바다는 말없이 잔잔하다.
아무도 없는 이 아침 바닷가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편안하다.
이곳 클라베리아는 루손 섬 북단, 카가얀 주에 위치한 작은 해안 마을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관광지는 몇 군데뿐이지만
그렇기에 더 고요하고, 더 깊다.
오전에는 Claveria Baywalk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긴다.
멀리서 고깃배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현지 어부들은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본다.
아주 어린 아이가 맨발로 뛰놀며 “Good morning po!” 하고 외친다.
여기선 나의 시간도, 언어도, 국적도 잠시 멈춰 선 듯하다.
점심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식당 Sea Breeze Eatery에서.
갓 잡은 생선을 튀긴 pritong isda에, 토마토가 얹힌 ensaladang talong,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그릇.
매 끼니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만족스럽다.
그리고 저녁이면, 숙소 앞의 슈퍼에서 맥주 한 캔, Red Horse를 사 들고 다시 바다로 간다.
7월 11일 – 클라베리아 뷰덱에서의 일출과 타갓 라군의 전설
아침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 숙소인 Casa Grand Inn을 나섰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클라베리아 뷰덱(Claveria Viewdeck). 숙소에서 약 2km 떨어져 있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갔다. 길은 한적했고, 새벽의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뷰덱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현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태양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바부얀 해협(Babuyan Channel)의 잔잔한 물결 위로 퍼지는 황금빛 햇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멀리 보이는 어선들이 하나둘씩 항구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였다. 이 순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 몇 장을 남겼다.
일출을 감상한 후,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현지에서 재배한 커피와 갓 구운 판데살(pandesal)을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오전 10시쯤, **타갓 라군(Taggat Lagoon)**으로 향했다. 이곳은 클라베리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아름다운 해안선과 독특한 바위 formations으로 유명하다. 특히 **아포 라카이-라카이(Apo Lakay-Lakay)**와 **아포 바켓-바켓(Apo Baket-Baket)**이라는 두 개의 바위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한때 부유하지만 인색했던 부부로, 도움을 청하는 노부부를 외면한 벌로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라군 주변을 산책하며 현지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손놀림은 숙련되고 부드러웠다. 한 어부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점심으로는 근처 식당에서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보았다. 특히,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시니강(sinigang)**은 그 맛이 일품이었다.
오후에는 라군 근처의 작은 해변에서 휴식을 취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해가 저물 무렵,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그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지인들의 따뜻함을 느낀 하루였다.
7월 12일 – 파타 등대의 고요한 수평선과 센티넬라 비치의 오후
아침 6시가 되기 전,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에 잠에서 깼다. 오늘은 조금 먼 곳, **파타 등대(Pata Lighthouse)**까지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Casa Grand Inn에서 오토바이 트라이시클을 타고 약 15분쯤 달리자 등대 입구에 도착했다. 등대로 올라가는 길은 제법 가파랐지만, 등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부얀 해협은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등대 꼭대기에서 바라본 바다는 경계가 없는 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따금 바람에 몸을 실은 새들이 날아가고, 저 멀리 작고 작은 배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다. 등대 아래 벤치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다.
등대 아래 마을로 내려와 소박한 해산물 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구운 갈릭 쉬림프와 라이스, 그리고 얼음 동동 띄운 칼라만시 주스 한 잔. 바닷바람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다.
오후에는 **센티넬라 비치(Sentinela Beach)**로 향했다. 모래사장이 넓고 조용한 이곳은 관광객이 거의 없어 오롯이 나만의 해변처럼 느껴졌다. 맨발로 모래를 밟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그늘 하나 없는 바위 위에 앉아 오래도록 파도 소리를 들었다. 시간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렀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작은 시장에서 구운 옥수수와 망고 한 봉지를 샀다. 숙소 테라스에서 먹으며 어둠이 깔리는 클라베리아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늘은 고요함 속에 깊이 잠겼던 하루였다.
7월 13일 – 마브낭 폭포의 시원한 숨결과 이바낙 마을의 이야기
이른 아침, **마브낭 폭포(Mabnang Falls)**로 향했다. 마을에서 30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 후, 나무들 사이를 따라 좁은 오솔길을 걷는다. 짧지만 가파른 트레일을 지나자, 숲속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폭포가 모습을 드러냈다.
폭포 아래 얕은 물웅덩이에 발을 담그고, 가방에서 꺼낸 조그만 사과 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쉬었다. 물은 차갑고 맑았고,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다.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하산 후, 근처의 작은 마을, 이바낙(Ibanag) 공동체를 방문했다. 마을 어르신이 다가와 자신들의 전통 이야기와 예전 어업 생활에 대해 들려주셨다. 어릴 적 해녀처럼 바다에서 소라를 따던 기억, 그리고 태풍에 쓸려간 바닷가 집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내린 생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점심은 마을에서 얻은 바나나와 코코넛 빵, 그리고 직접 내려준 진한 커피. 도시에서라면 ‘간단한 간식’ 정도겠지만, 여기선 한 끼가 되고, 기억이 된다.
숙소로 돌아오며, 오늘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오래된 이야기와 자연이 함께한 하루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7월 14일 – 클라베리아 시장의 활기와 한 그릇의 시니강
늦잠을 잔 아침. 이따금 이렇게 게으르게 시작하는 날도 필요하다. 9시쯤, **클라베리아 공공 시장(Claveria Public Market)**으로 향했다. 아침 장은 활기로 가득했고, 상인들의 손짓과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갓 잡은 생선이 얼음 위에 나란히 놓이고, 할머니는 직접 만든 **비빙카(Bibingka)**를 내밀며 “mainit pa”라며 웃어주었다. 간식으로 한 조각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다. 쫀득하고 구수한 맛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시장 옆 작은 식당에서 점심으로 **시니강(sinigang na baboy)**을 주문했다. 새콤한 국물에 돼지고기, 그리고 마늘이 진하게 스며든 밥. 단순한 구성인데도 속이 편안하게 채워졌다.
오후에는 강 옆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머니, 자전거에 형제를 태운 소년,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졸고 있는 개 한 마리. 아무 일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지만,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하루였다. 클라베리아의 삶에 가까이 다가선 날이기도 했다.
7월 15일 – 시미누블란 폭포에서의 정오와 숲의 속삭임
조용히 시작된 아침, 오늘은 **시미누블란 폭포(Siminublan Falls)**를 가보기로 했다. 현지 오토바이 기사와 흥정을 마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도착했다. 도로 끝에선 다시 걸어야 했고, 짧은 트레일을 지나 도착한 폭포는 기대 이상이었다.
폭포는 한적했고, 물줄기는 강하지 않지만 시원했다. 발끝에 닿는 물이 차가워서 눈이 번쩍 뜨였고,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일렁이며 속삭이듯 흔들렸다. 도시의 소음과 먼지가 이곳까지는 닿지 못하는 듯했다.
소풍용 돗자리를 펴고, 가져온 바나나와 판데살을 먹으며 책을 읽었다. 책은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눈은 활자를 따라가는데, 귀는 새 소리와 물소리에 끌리고, 마음은 이 조용한 풍경에 흠뻑 젖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더위가 올라왔다. 시원한 물줄기 아래에 잠시 앉아 머리까지 적셨다. 전신에 스며든 냉기로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하나. ‘여기 꼭 다시 오고 싶다.’ 그 마음이었다.
7월 16일 – 클라베리아의 작별과 약속 없는 재회
일곱 번째 아침.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늘 그렇듯, 이별은 마음 한구석을 슬며시 건드린다.
익숙해진 골목, 눈 인사 나누던 노점 아줌마, 트라이시클 기사들의 농담까지…
이제는 더는 낯설지 않은 것들이 이 도시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일찍 짐을 챙긴 뒤, 마지막 아침은 The Promise Cafe에서 커피와 시나몬롤을 주문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따라 더 푸르게 보였다. 멍하니 커피를 마시며 이 여정의 끝과 또 다른 시작을 함께 떠올렸다.
점심은 Guzmana Avenue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판싯 칸톤과 망고 쉐이크. 마지막 식사는 특별할 것 없이 담백했고, 그래서 더 의미 있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가방은 가볍지만 마음은 조금 무겁다.
클라베리아. 이 조용하고 순한 바닷마을은 나를 환대했고,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머물렀다.
다음에 다시 오게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곳은 이제 내 마음속의 조용한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연재(Series) >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27화/28화 (3) | 2025.06.07 |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25화/26화 (4) | 2025.05.23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21화/22화 (4) | 2025.05.10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9화/20화 (1) | 2025.05.03 |
| 필리핀 《북부 루손주 걷는 시간》 17화/18화 (0) | 2025.04.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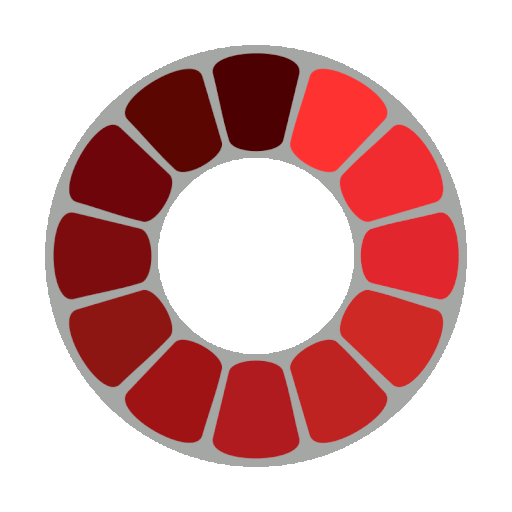
댓글